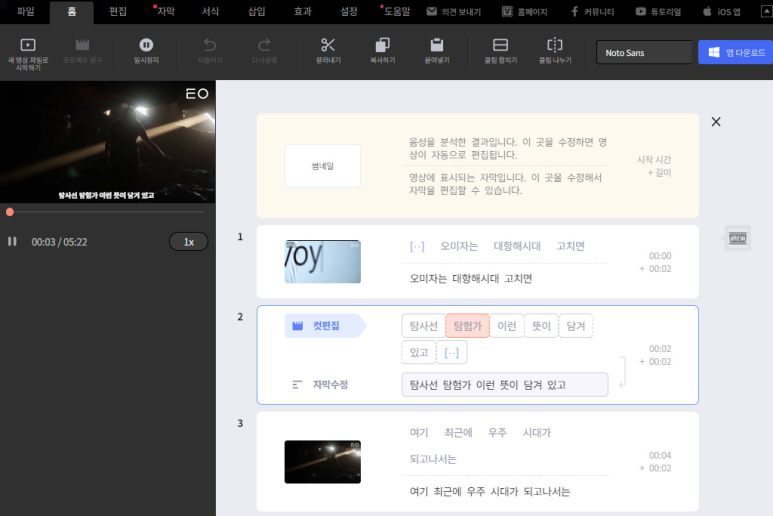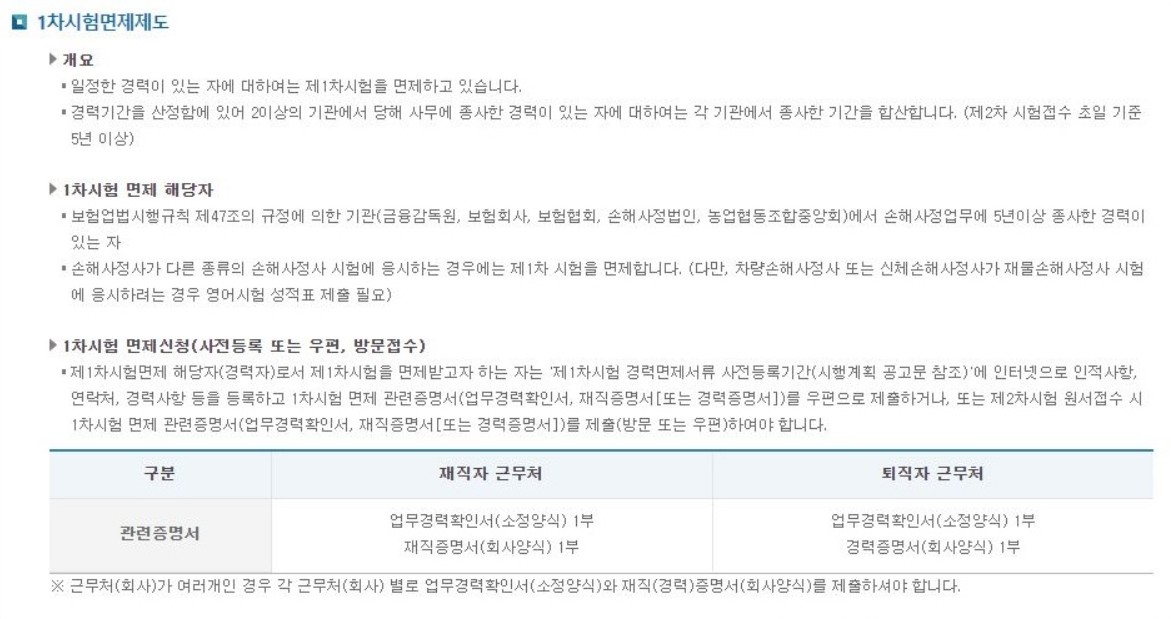흠…볼수록 편하고 깔끔하네요. 커버 스토리. 매력적인 컬러와 함께 시리즈, 시인, 제목의 초안 이름과 번호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아름답다 읽기 어려워도 계속 시를 찾는 이유는 제목이 먼저고 표지가 눈에 띄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시를 계속 읽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최초의 시인이기도 하다. 제목이 시를 많이 읽게 하는 초대장이 될 수 있을까 싶었다. 자주 보시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시 중간과 끝 부분에 한 줄로 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를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시를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시를 많이 읽어야 해”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무겁고 읽기 어려웠지만 그 안에 좋은 시가 많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많은 시가 필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목만 봐도 일상처럼 느껴지는 시들이 있다. 제목에 공감이 되어서인지 그런 제목의 시들이 기분이 좋고 재미있게 읽혔다. 그런 느낌의 시 중에 ‘집 수리’라는 시가 있었는데 제목부터 내용까지 그냥 기분이 좋았다.
전체적으로 3부의 시 “시를 만나서 쓰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 최고였습니다. 시를 평범하면서도 편리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인은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전단이나 벽에 걸린 포스터처럼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시를 전달한다. 춤을 추며 원하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편하게 다가가 보세요.
그래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안 봤는데 반성이었다. 아니면 깨달음인가? 편한 상대는 나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올해인지 작년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시집을 3권 정도 읽은 것 같다. 이 정도면 알고리즘이 시집 추천을 자주 해주지 않을까 싶다.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보셔야 합니다.